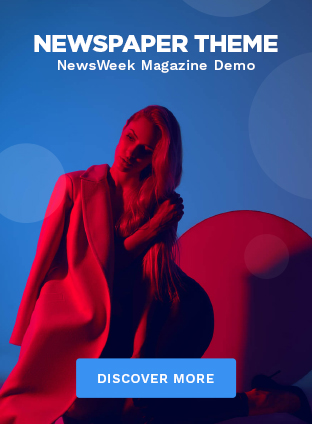기술은 질주하는데, 제도는 걸어간다
콘텐츠 생태계를 따라잡지 못하는 정책의 현재와 미래
“이제 법이 생기려나 봐요.
근데 제가 그 기술 쓴 지는 2년 됐는데요.”
한 콘텐츠 제작자의 말이다.
AI 영상 편집 툴을 쓰고,
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해 판매하며,
브랜드 숏폼을 기획한 지도 몇 년.
하지만 그 어느 것도, 법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.
⏱ 정책은 ‘사후’에 움직인다
기술은 현장과 사용자에 의해 먼저 발명되고,
제도는 문제가 터진 후에 움직인다.
그래서 콘텐츠 산업의 현장에선
“정부는 항상 한 발 늦다”는 말이 나온다.
🎯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?
1. 콘텐츠는 너무 빠르게 바뀐다
- 숏폼, 이모티콘, 챗봇, 메타버스, XR…
- 하나의 장르가 등장하고 대중화되기까지 단 1년
2. 기존 법률은 ‘형태 중심’
- 콘텐츠를 ‘방송’, ‘영상물’, ‘출판’으로 나누는 오래된 분류
- 이모티콘? NFT? 플랫폼 기반 창작? → 카테고리 외존재
3. 창작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
- 정책 입안 과정에서 현장 창작자와의 접점 부족
- 규제보다도 실질적인 창작 보호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
🇰🇷 한국은 지금 어디쯤?
- 2024년 기준, ‘디지털콘텐츠 진흥법’ 개정안 발의
- 문화체육관광부: 숏폼, 캐릭터 IP, 메타버스 중심 육성 계획 발표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: AI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중
- 하지만 창작 현장의 디테일 반영은 부족
🔍 해외는 어떻게?
- EU: AI Act 제정 → 생성형 AI 콘텐츠 투명성 의무화
- 미국: 저작권청, “AI 생성물은 인간 창작이 아닌 경우 등록 불가”
- 일본: 크리에이터 중심 ‘콘텐츠 백서’ 매년 발간
→ 정책과 시장을 동시에 설계하는 흐름 등장 중
🧭 뷰콘!뉴스의 시선
우리는 알고 있다.
정책은 기술을 통제할 수 없지만,
기술이 가져오는 불균형과 소외는 방치할 수 없다는 걸.
- 숏폼 시대, 3분 영상도 법적 분류가 안 되는 현실
- 지방의 창작자, 플랫폼에만 의존하다 소멸되는 생태계
- AI 시대, 창작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흐려지는 경계
✍️ 그래서 우리는 묻는다:
“정책은 언제까지 뒤따라갈 것인가?”
“앞서가는 콘텐츠, 따라가는 제도… 이 간극을 누가 메울 것인가?”
뷰콘!뉴스는 ‘정책과 현장의 대화’
를 연결하는 뉴스가 되고자 한다.
그리고 그 첫 질문을
지금, 이 기사로 시작한다.